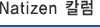'속고 싶으니까 속는다
한국인이 잘 속는 것은 가재의 심정으로 게 편을 들기 때문이다.'
교수, 학자, 기자, 아나운서, 검사, 판사, 시민운동가, 이들의 공통점은 무얼까. 진실, 정의, 양심, 객관, 이성, 소신, 외곬, 이런 긍정적 이미지가 이들에게는 썩 잘 어울린다. 자연히 사람들은 이들을 불편부당한 심판자로 여겨서 敵 또는 경쟁자의 집합에서 일단 제외시킨다. 그런데 우연히 이들 중 누군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꼈지만, 표현은 잘하지 못하던 것을 똑 부러지게 표현하면, 자신의 선견지명을 대견하게 여김과 동시에 금방 출세한 먼 친척을 만난 듯 살가운 느낌이 와락 몰려온다. 그 다음부터는 TV나 라디오나 신문에서 이들이 눈에 띄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옳지, 옳지, 바로 그거야!”
한두 개가 아니고 자기랑 의견이 여럿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
“바로 이런 인물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야.”
“그대는 우리 편! 나의 우상!”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자기편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말로,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 트윗으로, 무한 리트윗으로, RE: ... 전자우편으로, 전달, 전달! O사모 광팬의 모임이 여기저기 결성된다. 세상에, 심판이 우리 편이라는 것보다 든든한 일이 있을까. 끼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훌륭한 제3자가 하는 말이므로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훌륭한 그이가 하는 말을 불신하는 자들은 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틀려먹은 자들이라서, 애당초 인간 이하의 인간이라서 경멸하고 무시하고 욕해도 괜찮다고 본다.
일본이나 중국, 또는 서구와 달리, 삼국 통일 이후로 1300년간 중앙집권의 길로 일로 매진한 한국은 예로부터 권력만 잡으면, 특히 중앙 권력을 잡으면 지리산이든 삼수갑산이든 울릉도든 한두 다리 건너면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권력의 보너스 곧 富와 명예와 여색을 동시에 챙길 수 있었다. 권력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칼을 들고 설치는 게 아니라, 학문을 닦는 일이었다. (칼 들고 설치다가는 백의 아흔아홉 더하기 하나가 三族이 멸해졌다.) 과거에 등과(登科)하는 일이었다. 현대에 와선 이것이 최선은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나 거기는 누가 봐도 워낙 사기꾼이 많은 데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피하게 되었다. 차선은 뭔가. 考試에 합격하거나 학위를 받아서 언젠가는 마음속 큰 꿈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인의 최종 목표는 대개 정치다. 부모자식에게까지 속셈을 꼭꼭 숨기고 있다가 출세도 할 만큼 하고 사람들의 신뢰도 얻을 만큼 얻었다 싶으면, 특히 남자들이, 조선시대의 입신양명이 아직도 최고의 가치관인 구닥다리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에 앞서 선거판의 이전투구 와중에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민낯이 어김없이 드러나게 마련인 정치인들이 적자(赤子) 정당의 분식회계용으로 명망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한다.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는 이런저런 연줄로 순식간에, 1000명 정도의 신선한 피들이 떡고물, 김칫국물, 잿밥에 군침을 삼키며 몰려든다. 때 묻은 정치인과 깨끗한 제3자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셈이다. CEO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들도 정계를 쇄신할 신선한 피로 각광 받은 지 오래되었다.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잊은 노조 귀족들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작은 정치인에서 국가의 큰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한국에는 왜 음모설이 그렇게 매력적일까. 한국에는 왜 잘못된 건 모두 대통령 탓이라는 성급한 일반화(haste generalization)가 잘도 먹힐까.
그건 믿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속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기 때문이다. 가재는 게 편을 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보라. 대학생, 교수, 네티즌, 전문가(전문가 자처인 포함)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듯한 누군가가 대개 최초의 제보자이지만, 그것을 인터넷이나 SNS에서 낚아내어 속보로, [단독]으로 대서특필하거나 마이크를 들이대고 제보자의 육성을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韓流스타 뺨치는 표정연기와 함께 시청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 마디 슬쩍 끼워 넣는 자는 기자 아니면 아나운서다. 평소에 그런 기자나 아나운서가 이름이 잘 알려졌다면, 사람들은 일단 100% 믿어 버린다. 처음에는 자기 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관망자들이, 그 다음에는 선정적 반복 학습에 따른 부화뇌동으로 저쪽 편 사람들마저 너도나도 개탄한다. 울부짖는다. 거리로 뛰쳐나간다.
세월호 비극에서도 황색 언론(yellow journalism)은 처음부터 기승을 부렸다. 이번에는 민간 잠수사를 자처한 팔방미인 홍가혜가 제일 먼저 나와 실종자 부모와 국민의 애간장을 녹였다. 곧 이어 야망에 불타던 이종인이 등장했다. 그는 일반인이 잘 모르고 슈퍼스타 뉴스 진행자는 더 모르는 다이빙벨이란 걸 들고 나와 정부 불신, 청와대 불신, 대통령 불신이란 횃불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홍씨는 며칠 만에 바로 거짓이 들통 났지만, 천안함 폭침 때도 전문가를 자처하던 이씨는 열흘 이상 뉴스계의 슈퍼스타 손석희의 백댄서로 일생일대의 화려한 시간을 보냈다. 끝은 초라해 보였지만, 이미 황색 언론의 목표는 120% 달성된 후였다. 손씨가 말 없음으로 사과를 대신하는 사이에 이미 시위를 떠난 불신의 노란 화살은 푸른 기와집을 향해 한여름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으니까! 지지도가 71%에서 48%로, 검은 상복을 입고 노란 리본을 단 푸른 기와집 주인의 지지도는 그 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김대업처럼 이종인도 곧 용도 폐기되겠지만, 손씨는 여차하면 정계로 진출할 것이다.
그 사이 황색 언론은 불신의 조명탄과 비난의 기관단총을 계속 쏘아 올리고 냅다 갈기면 된다. 몇 마디 지시만으로 최소한 200명 이상은 더 살렸을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의 준 살인 혐의 대신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와 무능과 무책임을 집중조명하고, 생명을 담보로 수백 억 원을 어쩌면 수천억 원을 챙겼을 유병언 선주와 지방자치제에서 옛날 제후(諸侯)에 버금가는 시장, ‘최고 물류상’을 안겨준 세월호 관할 최고 책임자 송영길 인천시장 대신 중앙정부와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사과의 사과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무한책임을 지우며, 비난의 기관단총을 냅다 갈기면 된다. 독재자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목숨을 잃은 참수리호와 천안함의 도합 52水中 孤魂에 대해서는 휴전선 위로 평화의 비둘기를 날리고 서해의 하늘 가득 음모설의 인공 먹구름을 몰고 가면서 병아리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자들이 토끼눈으로 10여년 전 두 여중생에게 하염없이 흘리던 눈물을 이제 다시 열흘 스무날 줄줄 흘리며, 6.4 지방선거의 분노표 계산에 속으로는 연신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201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