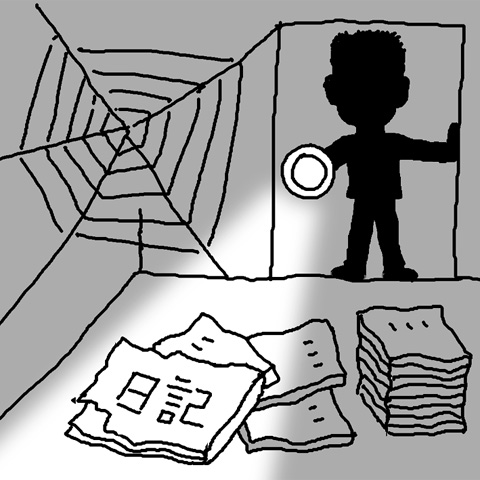무관(武官) 노상추가 68년간 쓴 일기… 조선 후기의 삶 생생히
노상추(盧尙樞·1746~1829)는 조선후기에 삭주부사·홍주영장 등 중급 관직을 지낸 무관이다. 역사학자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건에 관련됐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열일곱 살부터 시작해서 여든네 살에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남긴 일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을 지낸 문숙자 박사는 〈노상추일기〉를 토대로 조선후기 무반(武班) 집안과 촌락의 일상, 사회적 네트워크를 생생하게 복원한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너머북스)를 펴냈다.
노상추는 왜 일기 쓰기에 매달렸을까? 일기를 시작한 지 60년이 지난 1822년, 그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일기를 쓰게 됐다"고 기록했다. 열일곱이던 1762년, 아버지 노철(盧哲)이 큰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세상일에 흥미를 잃고 둘째였던 노상추에게 일기 쓰기를 물려준 것이다. 노씨 집안의 일기는 개인의 일상과 느낌을 적은 사적(私的) 기록이 아니라 가족의 대소사를 기록하는 가계(家系) 기록이었다.

- ▲ 《노상추일기》. 간지(干支)로 제목을 붙이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앞에 재(再)를 붙였다./너머북스 제공
노상추일기는 출생과 사망, 결혼, 부부관계와 성, 과거 준비, 관직 생활, 노비와의 관계 등 다양한 실상을 전해준다. 경북 선산 출신인 노상추는 문과에 뜻을 뒀다가 스물여섯부터 무과로 바꿔 10년을 매달린 끝에 급제했다. 그리고도 4년을 기다려 마흔 줄에 들어서서야 관직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을 기다리던 1782년 5월,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적었다. "내 500여냥은 모두 과거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굶어 죽는 것을 면하기 어려운 것인가. 공명(功名)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다." 관직에 나간 뒤에도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다. 57세 되던 가을, 빚을 갚지 못해 심하게 독촉받자, 친구인 덕원부사 이승운에게 편지를 써서 20냥만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도 있다.
일기에는 당시 한양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보여주는 대목도 나온다. 노상추는 변방인 갑산진의 동변장(東邊將)으로 나갔다가, 한양의 훈련주부에 임명돼 들어오면서 주동(鑄洞)의 집 사랑채를 27냥을 주고 세를 얻었다. 그런데 그 사랑채에 40냥에 들어오겠다는 이가 나타나자 집주인이 노상추와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게다가 집주인은 돈을 다 써버렸다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부동산 이중계약에 휘말린 노상추는 다른 곳에 여장을 풀 수밖에 없었다.

- ▲ 1829년 9월 여든넷 노상추가 죽기 직전에 쓴 일기.“ 어제저녁 이후 병으로 정신을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곁에서 수발하는 아들·조카의 전하는 말만 듣고 이를 기록한다”고 적었다./너머북스 제공
노상추는 혼인을 세 번 했다. 첫 번째 아내는 아들을 낳고 한 달 이상을 앓다가 죽었는데, 스물두 살이었다. 두 번째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 노상추의 어머니도 40대에 딸을 낳다가 세상을 떴다. 18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양반 집안에서도 이처럼 여성이 출산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하층민 여성들은 더 위기에 내몰렸을 것이다. 노상추의 일기에는 12명의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족보에 오른 것은 4명뿐이다. 가족 구성원의 3분의 2가 어릴 때 죽거나 서출(庶出)이라는 이유로 흔적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다.
노상추는 아내가 죽었을 때는 일기를 몇 달간 띄엄띄엄 거르기도 했고, 일기 대신 월기(月記) 형식으로 쓴 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둔 두 달 동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문병 온 지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쓸 만큼 치열한 기록정신을 보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6년 《노상추일기》를 4권으로 간행했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다.
사무엘 핍스(1633~1703)는 '영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핍스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은 그가 쓴 일기 덕분이었다. 그는 자기만의 사적인 얘기를 아무도 읽지 못하게 영어 대신 젊어서 배운 속기술로 썼다. 그리곤 능청스럽게 겉장에 '고대 그리스·로마의 속기술 연구'라는 제목을 붙였다.
▶핍스가 죽은 뒤 일기를 기증받아 해독한 케임브리지 대학은 내용의 솔직함에 기겁했다. 거기에는 아내와 함께 성당에 갔는데 옆줄에 앉은 여자가 하도 예뻐서 예배는 보지 않고 여자만 훔쳐봤다는 얘기, 어느 날 아내가 자기 머리를 빗겨주면서 이를 스무 마리나 잡았다는 얘기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일기가 완역·출간된 것은 핍스가 죽은 지 100년이나 지나서였다. 일기 내용을 갖고 시비 걸거나 흉볼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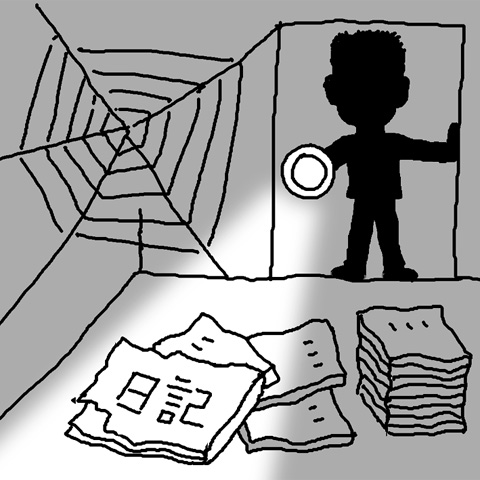
▶한글학자 한결 김윤경(金允經) 선생(1894~1969)이 작고할 때까지 60년 쓴 일기를 본 일이 있다. '1957년 10월 10일, 목요일, 맑음. 강의 두 시간. 이병기 중풍 위문. 최남선 작고. 시내버스비가 20환에서 30환으로 올랐다. 업자들 매수뇌물로 인함이 아닌지….' 일기엔 강의를 위해 딸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는 그가 꼿꼿한 선비정신으로 지켜본 세상사와 인간 군상들의 행태가 솔직히 기록돼 있었다. 한결의 일기는 사후 연세대 도서관에 기증됐지만 20년 동안 일반엔 공개되지 않았다. "너무나 사적인 내용이 많고, 일기에 언급된 인사 중 생존한 분들도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독설가 A 비어스는 일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남에게 얼굴 붉히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만을 매일 기록한 것'이라고 비꼬았지만 여전히 일기만큼 솔직한 문학 장르도 드물다. 일기에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쓴 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인간의 진실이 있다.
▶조선 후기 경북 선산 출신의 노상추(盧尙樞)라는 무관(武官)이 17세부터 84세까지 68년 쓴 일기를 토대로 역사학자 문숙자씨가 '68년의 나날들―조선의 일상사'라는 책을 출간했다. "10년 과거 준비에 내가 가진 돈 500냥을 다 썼다. 공명(功名)이라는 게 참 가소롭구나" 하는 고백이 과거(科擧)에 모든 것을 건 조선시대 지방 유생의 피곤한 인생을 역사책 어느 구절보다 더 절절하게 전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승정원일기'나 '충무공일기' '열하일기' '북정일기' 등 우리 일기 문화의 전통은 이처럼 튼튼한 기록정신의 저변에서 나왔을 것이다.